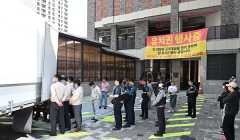초대형 이슈로 찬반 논란도 뜨겁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전략 정책토론회’에 앞서 “광주·전남은 천년공동체로,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 공멸 뿐”이라며 공생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던진 해결책이 행정통합. 그는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되는 추세이기에 통합은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사도, 부지사도, 실·국장도 아닌 준국장급인 대변인 명의로 짧은 입장문을 통해 “원칙론엔 찬성한다”면서도 “공감대와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절차상 문제를 삼아 법조계의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인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 즉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도시 위상과 관할 확대에 따른 주민자치 저하, 인사·재정권 재조정에 따른 힘겨루기, 도·농 불균형, 여기에 세수 감소와 기초의회 소멸에 따른 풀뿌리 약화, 공직사회 반발, 소모적 논쟁 시 예상되는 비난 여론 등도 걸림돌이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론과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다.
세계적 추세인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 건설, 소지역주의 탈피와 시·도갈등 종식의 확실한 대안으로 설득력을 얻어서다.
광주 146만, 전남 186만으로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낼 수 없고, 243만 대구와 266만 경북의 통합, 부산(341만)과 울산(114만), 경남(336만)을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세종 통합 논의, 프랑스 ‘레지옹’(광역지자체) 통합 개편과 일본의 행정 개편 등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고 본 이 시장의 판단에 공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330만 통합인구를 등에 업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입김이 세질 수 있고,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행·재정적 낭비와 중복투자는 줄일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4차 산업혁명시대 경제구조 개편이 시급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요구도 나오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버스노선, 교육행정구역 조정 등을 놓고 건건이 평행선을 달려온 시·도가 이제라도 ‘한 지붕’ 아래 모여 상생의 ‘교집합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통합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